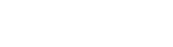제18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이용해 생체 조직 세포를 빛으로 제어하는 유전학 기술인 ‘광유전학’을 창시했다. 최근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시상식 전날인 3월 17일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병원과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을 둘러보고 광유전학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편집실>
▲ 칼 다이서로스 미국 스탠포드대 생명공학 및 정신의학·행동과학부 교수
Q. 아산의학상 수상을 축하한다
A. 과학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려면 창조성, 원칙, 정직성, 열정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님도 의학이라는 학문의 숭고한 정신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들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
Q. 광유전학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나
A. 바다에 사는 식물성 단세포 생물(녹조생물)의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인 ‘옵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지만 옵신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포유류에서 발현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포유류와 녹조생물의 세포 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시도했다.
Q. 실제 뇌 질환 치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A. 색소성 망막염으로 시력이 상실된 환자를 광유전학 기술로 치료한 연구 결과를 2021년 발표했다. 이처럼 빛으로 특정세포를 자극해 직접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를 광유전학으로 밝혀내 신약 개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느 세포에 무엇을 전달해야 뇌 질환 치료가 가능한지 연구가 진행될수록 광유전학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2004년 세포 수준 연구에 성공하고 첫 몇 년간은 움직이는 동물에도 광유전학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주변의 우려도 컸다. 2007년 어느 날 광유전학을 취재하러 온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뭐라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쥐의 뇌 우반구 운동피질에 광섬유를 삽입해 빛으로 자극해 봤다. 그때 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빛 자극을 중단했더니 쥐가 움직임을 멈췄다. 움직이는 동물에 광유전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순간이었다.
Q.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A. 민감도가 높은 옵신들을 개발하면서 수술로 광섬유를 뇌심부에 삽입하지 않고 뇌표면에 빛을 전달하기만 해도 뇌심부 뉴런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비침습적인 방향으로 기술적 진보를 이뤄갈 것이다. 또한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우리 연구팀이 쥐의 심근세포에 옵신을 발현시키고 적색 LED 조끼를 입혀 빛으로 자극했더니 심근세포가 활성화되고 심장 박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었다. 다른 장기들에 적용하는 연구도 지속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 연구도 확률이 매우 낮았지만 도전했다. 실패 가능성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게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