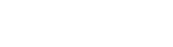모든 테크 회사들이 AI 열풍에 뛰어들던 2024년 가을, 유튜브에 애플의 새로운 AI기능에 대한 광고가 하나 올라왔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다.
모두가 바빠 보이는 사무실. 혼자 풀린 눈으로 먼 곳을 쳐다보거나 사무용품을 가지고 노는 한 남자가 보인다. 그는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 아이폰으로 글쓰기를 시작한다. 업무 메일에 구어적 표현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속어가 난무하는 내용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쓰고 있으니 옆자리 동료가 ‘또 저러고 있네’라는 눈빛으로 한심한 듯 쳐다본다. 그렇게 엉터리 이메일을 마무리한 남자가 애플 AI 기능 중 ‘Professional’ 버튼을 누르니 순식간에 수려한 문장들로 바뀐다. 이 이메일을 읽는 상급자 표정이 미묘하다. 그의 눈에는 ‘이걸 저 직원이 썼다고?’라는 강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광고는 여전히 사무용품으로 딴짓하는 직원을 보여주며 “Write smarter”라는 문구와 함께 끝난다.
필자는 애플사의 기기들을 좋아하고, AI의 쓰임새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광고는 분명 AI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마치 성실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AI만 있으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만나본 AI 전문가나 AI를 효율적으로 잘 쓰는 연구자들은 이와 정반대다.
그들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문헌을 찾고,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다차원 태그로 분류해 정리한 뒤, 자신에게 필요한 논문 위주로 AI를 학습시킨다. 또한 워드 프로세서 하나 켜놓고 평온하게(?) 논문 초고를 쓰던 이전과는 달리, 각종 최신 AI 모델에 논문 관련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의 사실성과 품질을 판단하며 원고를 써 나간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간단하게 ‘딸깍’ 한 번으로 좋은 논문을 만들어주는 AI는 없다.
ChatGPT와 같은 large language model(LLM)들이 급속히 발달해가는 과정을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딸깍’ 한 번으로 마법처럼 좋은 답변을 주는 AI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의학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딥러닝 기술에 지대한 기여를 한 컴퓨터 과학자 얀 르쿤(Yann LeCun)은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LLM들이 확률에 기반하는 특성으로 인해 정체기를 맞고 있으며 5년 내로 한물간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LM의 확률적 특성이 만들어내는 최대 취약점 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OpenAI의 o3와 o4-mini 모델들이 o1과 같은 예전 모델에 비해 유용한 답변들을 더 많이 제공하지만, 환각현상은 2배 이상 더 늘었다는 것을 보면 얀 르쿤의 전망이 신빙성 있게 다가온다.
AI는 이처럼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쓸모가 있다. 특히 우리 같은 비원어민 연구자들에게는 영어나 글 작성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확성이 생명인 의학 연구나 진료,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AI를 잘 쓰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다. 나 자신이 AI의 답변과 결정을 평가하고 보완해 100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인간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서울아산병원 사보 칼럼을 통해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해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기고를 마친 시점이 ChatGPT가 처음 등장한 2022년 12월경이었다. 그때부터 논문 작성에서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나름대로 활용 팁과 가이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뉴스룸 필진 제안을 받았다. 올 한해 필진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와 팁을 우리 직원들에게 소개해 보려 한다.
그 모든 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AI 시대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다.
우리는 AI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과 시간을 들여 지식을 쌓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글과 논문을 써야 한다. 공 들이지 않은 50점짜리 글과 아이디어는 아무리 좋은 AI를 활용해도 그 결과물이 결코 70점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 들인 90점짜리 글과 아이디어에 올바른 AI 활용이 더해진다면 120점짜리 결과물이 ‘딸깍’ 몇 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논문 작성에 있어 내가 먼저 전문가가 되는 법과 그 과정에서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120점짜리 연구자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임상의학연구소
임준서 박사
임준서 박사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원내 연구진의 논문 작성과 교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과 게재 및 AI 활용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접목해 논문의 질을 높이는 방법과 의료 연구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뉴스룸 칼럼을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