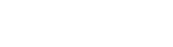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방영학 전문의는 대한폐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미세환경의 공간 분석 및 치료적 함의’를 주제로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폐암 환자의 치료 전후 미세환경 변화를 정량화하고 슬라이드 기반의 인공지능을 면역항암제 반응 예측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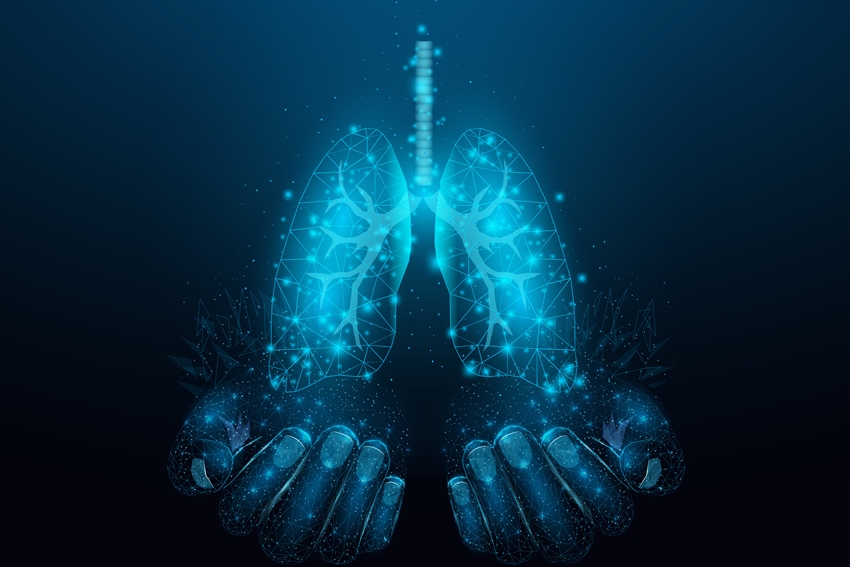
Q. 연구의 배경은?
A. 폐암 가운데 가장 흔한 비소세포폐암은 다양한 유전자 변이와 유두형, 미세유두형, 고형 등 조직학적 아형에 따라 암 주변의 종양미세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한 예로 EGFR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 내성이 생기면서 종양미세환경이 재편되고 면역세포 구성과 우리 몸의 방어 회피기전도 변한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됐다. 다만 기존 연구는 벌크 전사체 시퀀싱이나 암세포의 PD-L1과 같은 단일 마커 염색에만 의존해 공간적 이질성이나 세포 단위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세포 단위의 위치와 발현 패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전사체학,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해 세포의 상호작용, 미세환경의 이질성, 치료 반응에 따른 재편성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A. 면역항암제 치료 전 폐암 조직의 병리 슬라이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종양미세환경을 구성하는 암세포, 종양침윤림프구, 섬유아세포, 혈관내피세포, 성숙 삼차림프구 등 공간적 분포를 정량화하고 공간전사체(spatial transcriptomics) 분석으로 검증했다. 먼저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표적치료 전후 슬라이드 기반 공간 분석을 통해 치료 후 암세포 주변 면역세포의 감소와 혈관내피세포 증가 양상을 확인했다. 또한 EGFR 표적치료제 내성 발생 후에도 종양침윤림프구 밀도가 높거나 섬유아세포 비율이 낮은 환자는 면역항암제에 더 잘 반응하고 무진행생존기간(PFS)도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주도 돌연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군에서 치료 전 슬라이드와 예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종양침윤림프구 밀도가 높고 종양영역 내 성숙 삼차림프구가 관찰되는 경우 면역항암제 반응률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슬라이드 기반 인공지능 분석이 치료 반응 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양미세환경 내 세포 구성과 변화를 공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진 EGFR 변이 폐암에서도 일부 환자군에서는 치료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A. 향후 폐암을 넘어 다양한 암종을 포괄하는 오믹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암 치료 이력, 예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다기관·다치료 환경의 치료 전후 데이터를 수집해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자 한다.
관련 의료진
연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