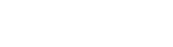“내 열심히 살믄서 재산 쪼매 쌓고 이제 한숨 돌릴까 했드만, 한방에 나자빠지니까 이게 내 인생의 말로인가 싶어서가, 하이고마···.”
생의 마지막이 지금 이렇게는 아니라는 생각에 조웅제 씨(74)는 ‘억수로’ 살고 싶어졌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10가지 치료에도 진척이 없을 때 새로운 CAR-T 세포 치료제 소식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교수님한테 어떻게든 그 치료만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아이가. 그것만 받으면 여한이 없다꼬.”

불길한 조짐
2013년이었다. 산에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증상이었다. 조웅제 씨는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하고 일행과 떨어져 혼자 산에서 내려왔다. 개울가에서 손을 씻는데 갑자기 물이 하늘로 치솟는 듯했다. 눈앞이 핑 돌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은 것이다. 다행히 멀리서 사람이 달려왔다. “왜 그럽니까?” “가방 안에 아스피린 좀….” 알약이 혀끝에 닿자 물도 없이 꿀꺽 삼켰다.
눈을 떴을 땐 충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부산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가족들은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자 집 근처에서 치료받겠다며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혈압이 높고 심혈관이 70% 정도 막혀 있다곤 하지만 딱히 아픈 곳은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조급하던 마음도 사그라들었다. 죽음을 싹 잊은 듯이, 남은 생을 셈하지 않은 채 5년이 흘렀다.
2018년 5월. 회식 자리에서 소주 두어 잔을 기분 좋게 비웠다. 술과 담배는 여전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동자가 풀리며 어지러웠다. ‘어이쿠야, 5년간 내가 병을 단단히 키워왔는갑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검사를 받아보니 CT 영상이 온통 까맸다. 폐암 진단이었다. 이제는 최선의 치료를 찾아야 했다. 서울아산병원에 전화해 무조건 빠른 진료를 예약했다. 서울로 가는 길 내내 근심이 가득했다.
‘확 죽어삐까’
첫 진료에서 만난 의사는 바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뭔가 다른 짚이는 것이 있는 듯했다. 폐암이 아닌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이었다. 처음 들어본 병명에 ‘그래도 폐암은 죽을병인데 그보다는 낫지 않겠나?’ 안도했다. 하지만 검색 결과 훨씬 심란한 내용이 펼쳐졌다. 기대 여명이 6개월 이내라는 것이다.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의 치료가 시작됐다. 항암 치료 후 암의 95%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윤 교수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혈액암은 남은 5%만으로도 순식간에 싹 번질 수 있는 악성 종양이었다.
시도하는 약마다 모두 불응성이 나왔다. 재발은 계속되고 죽음의 디데이가 시작된 것 같았다. 새로 시도한 임상약은 너무 독해서 밥 한 숟갈도 삼키기 어려웠다. 63kg이던 몸무게는 순식간에 50kg까지 빠졌다. 아무 기력 없이 누워있다 보면 ‘확 죽어삐까’하는 마음만 들었다. 효과 좋은 면역 주사가 있다는 이야기에 일본에도 다녀왔다. 1회 투여에 무려 5천만 원이었다. 컨디션은 빠르게 나아졌지만 근본 치료는 아니기에 9개월이 지나자 몸 상태는 다시 나빠졌다.
비싼 주사에 의지해 여생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 비행도 쉽지 않았다. 이제껏 세무사로 살아온 그의 삶은 정확한 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노력한 만큼 결실도 찾아왔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찾아온 병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예상한 결과를 비껴갔다. 신의 가호를 떳떳이 빌고자 조금 더 정갈하게 생활했고, 내일에 도착하려면 뜬구름 같은 희망이라도 꽉 쥐어야 했다.
모두의 간절함이 담긴 치료
윤 교수는 새로 출시된 CAR-T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환자에게서 T세포를 뽑아 유전자 조작으로 암세포를 인식하는 특수 수용체를 달아 다시 환자 몸에 주입하는 면역 치료였다. 윤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병원에 도입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다행히 마지막 표적 치료제가 반응을 보이며 얼마간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CAR-T 치료를 먼저 시작한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하루가 급한 그의 마음도 흔들렸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병원은 안 옮기련다. 윤 교수님은 시작부터 내 상황을 잘 아는 분이고, 죽어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겄나?”라며 가족에게 결심을 밝혔다. 25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장 폐색이 찾아왔고 CAR-T 치료를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길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산에 오르며 이를 악물고 견뎠다. 의료진이 아무리 잘 판단해도,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와도 결국 환자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마음은 분명했다.
2022년 2월. 우리 병원 CAR-T 치료의 첫 임상 기회가 주어졌다. 윤 교수는 그의 간절한 기다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혈구 성분 채집이 두 번이나 실패하면서 실망감도 들었다. 전담간호사인 김영선 과장에게 “우리 아들이 좋은 짝 만나서 아웅다웅 사는 것까진 보고 싶은데, 그게 힘들 수 있겠다 생각하니 참 답답하대”라면서 “선생님요, 내는 이 치료 받고 덜도 말고 딱 5년만 더 살았으믄 싶어”라며 작은 소망을 털어놓았다. “저도 환자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CAR-T 치료제 ‘킴리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직후 우리 병원 첫 환자로 조웅제 씨에게 시도됐다. 모두의 간절함이 담겨서인지 T세포를 발현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무사히 투여할 수 있었다. 얼마 후 산책 중에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인간 승리예요!” 윤 교수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검사 결과, 암을 다 썰어낸 듯 깨끗하다는 것이다.
“항시 조용하던 교수님이 전화해서 나보다 더 좋아했데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노. 주치의가 그래 좋아하니까 내 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암이 불치병만은 아니라는 걸 내 온몸으로 확인했데이~”
남은 인생은 싱글벙글
진료 날, 그는 아들을 앞세웠다. 생명의 은인에게 예의를 차려 인사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드디어 장가간 아들은 손주도 안겨주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내는 교수님 아니면 죽었다 아입니까.”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도 윤 교수는 한사코 거절했다. “병 다 낫고 드리는 게 우째 뇌물인진 모르겠는데, 그럼 서울아산병원에 기부나 봉사라도 해야겠다 찬찬히 마음 먹고 있데이.” 조웅제 씨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부산 집으로 향했다.
“암 환자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제일이라 아이가. 귀한 약 맞고 제 멋대로 살면 쓰나. 남은 인생 즐겁게 살믄서, 마음 곱게 먹고. 맞제?”
관련 의료진
연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