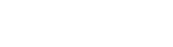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 시기 한강 공원에서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가을산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는 이들이 있다. 바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들이다. 현장에서 이 질병의 무서움을 직접 목격한 의료인으로서 그 위험성을 생생히 전하고자 한다.
“환자 사망, 치료하던 의료진 7명도 감염…정부도 놀란 바이러스.”
2025년 8월 30일, 한 포털 사이트 메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지방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SFTS 환자 심폐소생술 도중 의료진 7명이 2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치명률이 높아 의료 현장에서 철저한 감염관리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이름 그대로 고열과 혈소판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며,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 간 감염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보통 5~14일. 발열과 식욕부진, 설사, 오심 같은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악화되면 의식 저하,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다. 치명률은 약 20%에 달하고, 아직까지 특이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대증·지지요법에 의존한다.
작년 여름, SFTS 양성 환자가 위장관 출혈 지혈술을 마치고 응급실에서 병실로 이송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착한 환자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차갑고 축축한 피부, 굳은 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 몇 일 동안 발열과 설사 증세가 있었지만 불과 어제만 해도 환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는데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기저귀를 열자 선지처럼 굳은 핏덩이가 쏟아졌고, 몸을 돌릴 때마다 주먹만 한 혈괴가 흘러내렸다. 구강 흡인을 하자 피 섞인 침과 가래가 흡인기에 고였다. 당황할 틈도 없이 혈장교환술이 시작되었고, 수액과 수혈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승압제 용량은 점점 높아졌다. 39도까지 치솟는 발열과 전신 발작 속에서 환자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입원 3일 만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다.
감염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코로나19, 원숭이두창, 쯔쯔가무시, AIDS 등 수많은 감염 환자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어 생을 마감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 환자는 그저 자신의 텃밭을 가꾸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차마 잔디밭에 마음 놓고 앉을 수 없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SFTS는 4월에서 11월 사이 특히 농작업·성묘·등산이 늘어나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진드기는 풀숲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 어디에나 서식하기 때문에 애초에 풀숲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야외활동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긴소매 옷과 긴 바지, 장갑과 장화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는 풀 위에 그냥 앉거나 옷을 벗어 두지 말고 반드시 돗자리나 깔판을 사용하자. 귀가 후에는 야외에서 입었던 옷을 따로 세탁하고, 샤워를 하면서 몸 구석구석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에서는 심폐소생술 중이거나 사망 환자의 시신을 접촉한 의료진·장례지도사에게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의심 환자를 신속히 선별하고 마스크·장갑·가운은 물론 필요 시 고글과 안면 보호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응급간호팀
정환지 주임
응급간호팀 정환지 간호사는 부인암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는 유행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관리센터 27병동에서 근무 중입니다. 뉴스룸 칼럼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진의 숨겨진 노고와 이야기를 공유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발견한 희망과 의미를 생생하게 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