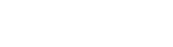5년 전, 뇌사상태에 빠진 6개월 된 아기의 부모가 장기기증에 동의해 신장기증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식 순서가 되는 대기자들은 아기의 신장을 이식받는 것을 주저하였다. 아기의 신장은 크기가 어른
신장의 반이 안 되고, 기능도 미성숙해 일반적인 신장이식에 비해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수혜자 역시 50대의 중년 여성으로 아기의 신장을 받기를 주저하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신장이식팀에서 쌓아왔던 노하우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김영훈 교수는 환자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였고 환자는
믿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6개월 된 아기의 신장은 50대의 중년 여성에 몸에 잘 정착해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능하고 있다.
제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교수의 환자가 처음부터 아기의 신장을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신장 이식 수술은 암 수술과는 다르게 투석만으로도 평생을
영위할 수 있어서 그녀 역시 수술의 위험성을 감수하느니 번거롭지만 투석을 하며 사는 쪽을 선택하려 했다. 수술을 받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던 그녀를 김영훈 교수는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아기의 신장을 이식하는 게 까다롭긴 하지만 수술에 자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환자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신장 이식수술의 기술은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식 수술이
잘 됐을 경우 극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식 후 건강한 신장기능을 되찾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투석할 때와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다.
환자의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그는 병원이 위치한 송파구 풍납동 근처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주말에 슬리퍼 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가 진료했던
환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얼핏 보기엔 아픈 기색이 전혀 없는 평범한 동네 주민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면
그보다 반갑고 뿌듯한 게 없다고 한다. 수술 이후 환자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환자의 평범한 일상이
김영훈 교수에겐 가슴 벅찬 기쁨이 된다.
생불(生佛)이라 불리는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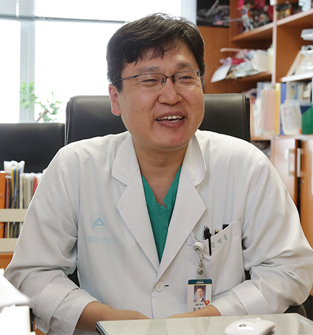
생사가 달린 수술이라면 환자를 설득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수술이 필수가
아닌 신장이식의 경우 매번 설득의 문제가 따라붙는다.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를 뚫고 환자가 수술을 결심한다면, 그것은 담당 의사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교수는 어떻게 환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방법에 대해 묻자 바로 명쾌한 답변이 돌아온다.
“자주 가서 봐야죠. 자주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아주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냥 사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환자분은 중학생
아들이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매번 하세요”
환자가 의사에게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건 그만큼 주치의가 편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김영훈 교수는 무슨 이야기라도
잘 들어줄 것 같은 푸근한 이웃집 삼촌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김영훈 교수의 별명이 ‘생불(生佛)’이라고 슬쩍 귀띔해준다.
살아있는 부처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는 일 한번 없이 항상
인자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당신의 평범한 삶을 위하여
요즘 김영훈 교수는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 있게 연구 중이다.
환자들이 자신을 만나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의 마음이 담긴 연구방향이다. 수술과 진료, 연구까지 쉴 틈 없이 바쁜 탓에
요즘 한창 놀아 달라 보채는 9살, 7살 난 두 아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들다.
환자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 자신의 일상은 잠시 제쳐놓았지만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환자들을 보면
행복하다며 웃는 그. 환자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인 듯 웃는 그 인자한 미소에서 진심이 묻어났다.
관련 의료진
연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