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요.”
짧은 한마디가 그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다.
환자를 잃었을 때의 괴로움을 숨기지 못했다. ‘미안한 사람’으로 만드는 불편한 공기가 동료 의료진을
낙담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환자실.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도 아픔을 함께 견뎌내야 하는 곳.
그곳에선 누구나 겸손하지만, 강해져야 한다.
젊은 외과의사의 도전
일반외과 홍석경 부교수가 담당하는 외과계 중환자실은 일반수술, 외상, 이식 수술 후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생의 끝에 힘겹게
매달린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 의사. 그래서일까. 겉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강하다’.
처음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던 날. “선생님, 살려주세요.” 지푸라기처럼 마른 손으로 어린 의사의 손을 꽉 쥐던 환자의 손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의기였을까요? 응급콜을 받고 밤낮으로 병원을 뛰어다녀도, 젊은 기운에 힘든 줄도 몰랐죠.”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의들 아래서 수련한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이 더해졌다.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지만,
손 쓸 수 없는 환자 앞에서는 무력감도 느꼈다. 외과를 좋아했지만 좀처럼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외과를 선택한 것이 필연이었다면
중환자실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었다. 전공의 4년 차의 끝에서 그녀는 간담도췌외과로 진로를 결정했다.
그러다 알게 된 임신 소식. 다른 과로 가야 할지 개원을 해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당시 외과 과장이던 이승규 교수가 그녀에게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의를 제안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해 보겠습니다.” 3주간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 앞에는
다른 외과 의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것, 미국 의사 고시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울고, 웃고, 배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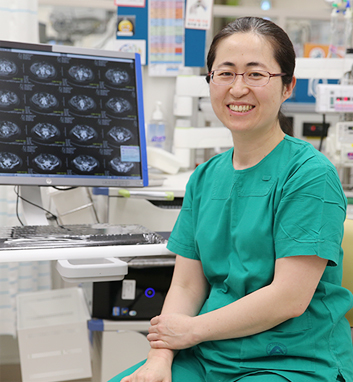
국내 최초의 외과계 중환자실. 평소 관심이 있던 일을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의욕이 넘쳤다.
그러나 외과계 중환자실을 경험한 적도, 구경한 적도 없었다.
왕초보나 다름없었다. “다급한 마음에 한 곳만 보고 질주했지요.”
최고의 집도의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늘 뒤따랐다. 계획이 하나씩 실현되어도 초조했다. 동료들이
쫓아오지 못하면 안달이 났다.
불도저같이 달리던 5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환자와 함께 보내고
나서야 중환자실의 틀이 조금씩 잡혀갔다.
그제야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서도
못 놔줬던 환자들, 압박감과 불편한 환경으로 낙담한 의료진들.
모든 환자를 살려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주변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모두들 가끔은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을텐데…’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 책임자는 전체를 볼 줄 알고,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어느새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답은 현장에
홍석경 부교수는 울산의대 4기로 졸업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성장했다. 의대 시절, 교실에서 만난 의료계 최고수들은 권위의식 대신
소탈함과 여유를 지니고 있었다.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오로지 병을 고치는 사명감으로 사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의
모델이었다.
홍석경 부교수와 함께하는 동료들은 그를 ‘열정과 용기, 그리고 사명감이 몸에 배어 있는 의사’라고 했다. 스승을 닮은 제자.
그는 ‘환자와 1m 멀어져 있는 의사는 당직실에 있는 의사와 다를 게 없다.’며 동료와 후배들에게 늘 환자 곁에 있기를 강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은 환자에게서 나온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지금까지 진단, 치료, 수술만 하던 젊은 의사들에게는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남다른 경험일 거예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 마디의 위로와 토닥여 주는 따뜻한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요한 시간.
방으로 돌아온 그녀의 전화기가 또 다시 울리기 시작한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관련 의료진
연관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