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1년 동안 당신의 위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듣는 1년의 건강보증,
소화기내과 김도훈 선생님의 확신에 찬 어조,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고 싶어졌다.
5㎜의 칼날로 가능해진 내시경 치료
상부위장관, 즉 식도, 위, 십이지장의 병변의 진단 및 내시경치료를 하는 김도훈 선생님은 생명전선에서 환자를 만나고 싶어 내과를 선택했다고 한다. 진료도 하고, 시술을 통한 치료도 하는 소화기내과는 그래서 당신에게 딱 맞는 분야라고 했다. 최근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을 통해 위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기암 발견이 늘었다. 치료 내시경의 칼날은 겨우 0.5센티미터, 이 작은 칼날로 개복하지 않고도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선생님은 상부위장관의 병변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라며, 4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음량 증폭기가 있는 진료실
선생님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연세가 지긋해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고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인 자녀에게만 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믿는 선생님은 고민 끝에 묘수를 찾았다.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음량 증폭기가 놓였다. 그 후, 찬찬히 진료 결과를 설명하노라면 연세 드신 환자도 잘 알아들으신다고 한다. 문득 연세 지긋한 아버지와 다정한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환자의 입장까지 헤아리게 된 건, 오래 전 경험 덕분이라고 했다.
많이 사랑 받고 많이 배운 공중보건의사, 김도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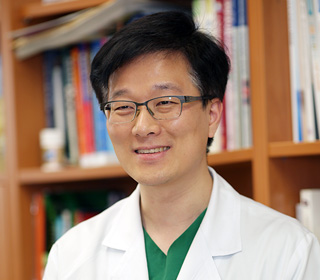
선생님은 경상남도 진영의 작은 시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 시절을 보냈다.
환자들의 대부분은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아파도 딱히 털어놓을 데가 없어 혼자 찾아오던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던 순박한 의료진…
그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선생님은 달라졌다고 한다.
혈기왕성한 전공의 시절에는 진료 결과와 지식만을 전하려고 애썼다면, 공중보건의로 지내는 동안 환자의 아픈 곳과 처해진 상황까지 더불어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단다.
꼬깃꼬깃 접은 돈 2천 원을 쥐어주시며 맛난 것을 사먹으라던 할머니, 김치 떨어질 날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배운 그 감사한 날들이 지금의 ‘사람 냄새 나는 의사’, 김도훈 선생님을 만들었지 싶다.
치료 의지를 심어주는 당신의 마지막 의사
김도훈 선생님에게 ‘의사’란 어떤 의미일까? 선생님은 공자의 말을 빌어 그 답을 대신했다.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김도훈 선생님에게 ‘의사’란 그렇게 즐거운 일이다. 호기심 많고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한다는 선생님은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다음 만나기까지 300여 일의 긴 시간을 환자가 잘 버틸 수 있게 치료의지를 심어주는 의사,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병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며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그것이 김도훈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의사’다.
어느 날 초진 환자가 김도훈 교수님의 진료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료 예약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 딱히 아는 이도 없고 누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지도 막막하던 그때,
상담직원이 살짝 귀띔을 해줬단다.
“병원 직원들이 가족들의 진료 때 가장 많이 부탁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어찌 좋은 의사를 꿈꾸지 않겠는가
관련 의료진
연관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