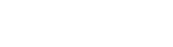1분에 약 70회. 1시간이면 약 4,200회. 우리 심장은 매일 1분 1초가 바쁘게 뛰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심장 박동을 느낄 새는 그리 많지 않다. 세간에는 ‘다시 뛰는 심장’ ‘내 심장이 뛰는 일’ 등 열정적인
마음을 표현할 때 앞세우는 것이 바로 심장이지만 정작 심장내과에서 듣는다면 너무도 위험한 말이다.
빨리 뛰는 열정적인 심장도, 본분을 잊고 너무 느긋한 심장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심장내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김준 교수는 ‘부정맥’이라고 진단해준다.
심장을 치료하는 의사
부정맥은 심장을 수축하게 하는 전기 신호에 이상이 생겨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다. 김 교수는 심장내과 중에서도 바로 이
부정맥을 세부 전공으로 삼았다. 얘기에 앞서 김 교수는 본인의 진료 활동 중 약 10~20%는 외과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한다.
그도 그럴 것이 김 교수는 일주일에 10~15건, 한 달이면 40건 정도의 시술을 소화하고 있다. 내과 영역 중 유일하게 피부 절개를 하는
수술이다. 영구형 심박동기나 빈맥성 부정맥을 완치하는 전극도자절제술 등의 시술이다.
“부정맥은 수술로 ‘완치’할 수도 있어요. 보통 수술 후에는 약을 먹고 관리해야 하는 병이지만 전극도자절제술은 부정맥을 유발하는
부위를 카테터로 절제하거나 괴사시켜 완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이 김 교수를 심방세동 세부 전공으로 이끈 매력이다. 하지만 모든 수술 사례가 ‘완치’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술 후 부정맥 악화, 심낭압전 등의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 김 교수는 환자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충분히 설명해주고 환자가 자신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안심(安心)이란 치료
.jpg)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일은 생각보다 불안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게 한다.
그래서 부정맥 환자 중에는 유독 예민하고 꼼꼼한 환자들이 많다고 한다.
증상이 생길 때마다 일지를 작성해 진료 때 가져오는 환자들도 가끔 있다.
그럴 때 김 교수가 하는 처방은 ‘안심(安心)’이다.
“말씀하는 증상과 심장질환을 확인해 보고, 안심시켜드리죠. 우리 몸에 점이나
주근깨가 있어도 그냥 살잖아요. 부정맥도 비슷합니다. 급사의 위험도가 낮은
부정맥의 경우엔 두근거림을 참고 견뎌 나가면 됩니다.”
작은 증상도 환자들에게는 크고, 심각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런 환자들의 말 속에 치료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은 모든 걸 세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속에 질환의 중증 정도나 변화, 합병증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환자의 증상을 느끼지만 의사는 진단한다.
“환자에게 잘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에게 성공적인 치료를 하는 게 바로 잘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고 시술,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김 교수의 꿈은 새로운 치료의 개발보다 표준화된 치료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어떤 환자라도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게 바로 김 교수의 연구 목표다.
이런 김 교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심장을 치료하는 일은 결국 ‘마음’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든다. 환자를 잘 치료하고자 하는 김준 교수의 뜨거운 마음이 결국 좋은 치료 성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련 의료진
연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