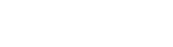“제가 좀 내성적입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또 느긋한 편이라 인내심도
있고요”
재활의학과를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김대열 교수는 대뜸 자신의 성격 얘기부터 꺼냈다.
“재활치료는 극적인 기적을 만드는 치료가 아닙니다. 더디게 회복하는 재활의 특성상 환자도 의사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끊임없이 마음을 북돋워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마저 재활해야 진짜 성공한 치료라고 말하는 김대열 교수, 그가 만나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격려가 회복으로
재활의학과는 처음 환자가 오면 치료사들과 환자의 회복 정도를 예측한다. 대부분 뇌졸중이나 뇌 손상 혹은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
마비가 온 환자들이다. 이 중 불가피하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도 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활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몇 년 전, 뇌간 손상으로 입원한 50대 남자. 뇌간은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뇌줄기다. 이곳이 손상되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심하게는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 환자 역시 눈만 깜빡이는 상태로 김 교수를 찾았지만 1년 후,
지팡이에 의지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뇌간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의 회복 정도로는 드문 일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재활의 의지가 컸던 환자라고 기억했다. 처음 주먹 쥐기도 힘들던 환자가 한 걸음의 발걸음 떼기 위해서는 실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죽은 운동 신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비된 신체 부위를 움직여 손상된 뇌를 꾸준히 자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교수는 무엇보다 환자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마음 쓴다. “열심히 재활하세요.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지만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파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연구는 재활 진료의 뿌리
.jpg)
지금까지 김 교수가 발표한 논문만 해도 50여 편이 넘는다.
전문의가 된 이래 재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덕분이다. 앞서 말했듯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의학연구에는 윤리가 있어야 해요. 발표한 논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단 1편의 논문을 써도 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한 걸 써야
해요. 연구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뿌리와 같은 거니까요”
뿌리가 튼튼해야 환자들이 회복이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는
김 교수.
美 신경 재활학회 ‘최우수 포스트 상’(2005), 대한 재활의학회
‘젊은 연구자상’(2008)을 받으며 연구 성과 또한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의사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은 따로 있다.
‘선생님’이란 말에 뭉클해집니다
“언어 신경 장애가 있는 환자는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던 환자가 어느 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란 말을 합니다.
의사로서 보람이 따로 있겠어요. 이 순간을 위해 의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보러 오는 환자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며 ‘어떻게 지내셨어요’라고 묻는 것이 또한 나의 역할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김대열 교수의 말이 든든하다.
관련 의료진
연관 콘텐츠